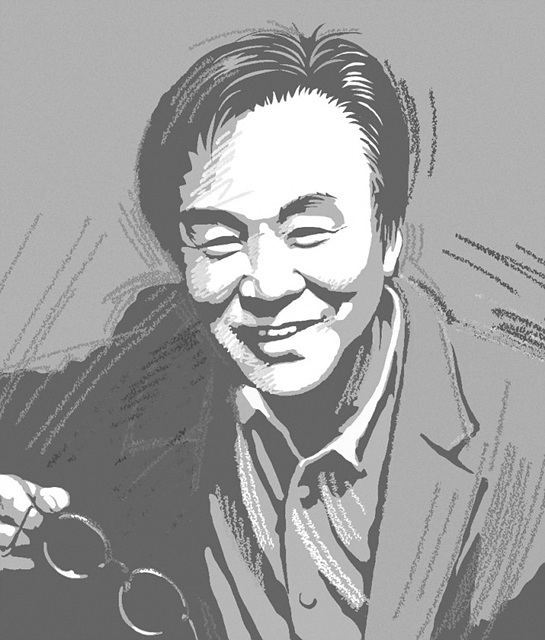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이사장 이준영
시간은 서두르지 않는다. 계절을 재촉하지도 않고 별을 옮기지도 않는다. 미개한 우리의 지식이 달려가고 불을 품고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 창백한 육신이 시간 속에 깊이 숨어서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한다. 내 꼬리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고 생각은 정처없이 떠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면 하늘에 닿을까? 오늘도 시간이 주는 계절에 젖어 낙엽을 주워들고 있다.
원로목사님들과 설악산에서 아직도 몸서리치는 글을 가득 써놓은 붉은 낙엽을 보았다. 바위사이로 달음질하는 물줄기가 야상곡의 고요함처럼 깊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은 허우적거리면서 기어이 눈을 감고 말았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산 자들이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어있는 자는 무덤을 가르킨다. 문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모든 원인의 시작과 끝은 내 자신이다. “삶이란 얼마나 하찮은가. 어제는 한방울의 정액이었고 오늘은 시신 아니면 재다. 그러니 너는 이 덧없는 순간들을 자연이 너에게 의도한 대로 쓴 다음 흔쾌히 쉬러가라 . 때가 된 올리브 열매는 자신을 잉태한 대지를 축복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나무에게 감사하며 땅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월간 써드에이지를 창간하고 우리는 세상과 이 시대의 생각과 정신을 새기고 있다. 자연의 소리를 모아 음악을 만들고 바람의 자국으로 노래를 부른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뜨거운 입맞춤의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이다. 살이 닿아 꿈틀거리는 심장소리는 이 작은 종이위에서 세상 입술에 흘린 가여운 눈물이 되어 백합 한송이의 향기로 바람이 된다.
우리 가슴에 묻어버린 영혼의 등불은 기적이 된다.
하늘에 던져도 부서지지 않고 바다에 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의 한 조각, 계절은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애써 나를 포옹한다.
잠시 내 품에 안겼다가 떠나는 계절을 바라보며 지금 막 올려진 제철 과일과 원두 한잔으로 어떤 의미의 매력을 찾아본다. 한 글자가 소중해 곱십다가 끝내 읽지 못하고 지워버리는 연애편지처럼 가슴앓이가 되어도 좋다.
시대의 오류조차도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했던 것들을 우리는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덮는다.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조차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시대를 넘어 이제 화해의 손길들이 내밀어지고 있지 않는가.
종교개혁자 장 칼뱅에게 인문학자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1515~63)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 종교적 살인으로 불리는 세르베투스 사건이후 350년이 지나 화해의 기념비를 세웠다. 화형장이었던 제네바 샹펠 광장에 있는 묘비에는 “위대한 개혁자 칼뱅을 존경하는 후예들로서 그 시대의 오류이자 그의 오류를 척결하고 종교개혁과 복음의 진정한 원리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견지하면서 1903년 10월27일에 이 화해의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쓰여져 있다.
100시대, 복잡한 세상의 한 곁에서 써드에이지는 이 시대의 정신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또 다시 찾아오는 계절은 또 다른 목소리로 속삭여 줄 것이다. 우리가 보는 무대 뒤에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삶은 목소리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이 계절의 속삭임은 추억과 뜨거운 열정으로 종이위에 눈물을 바르고 사라질 것이다.
문형봉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